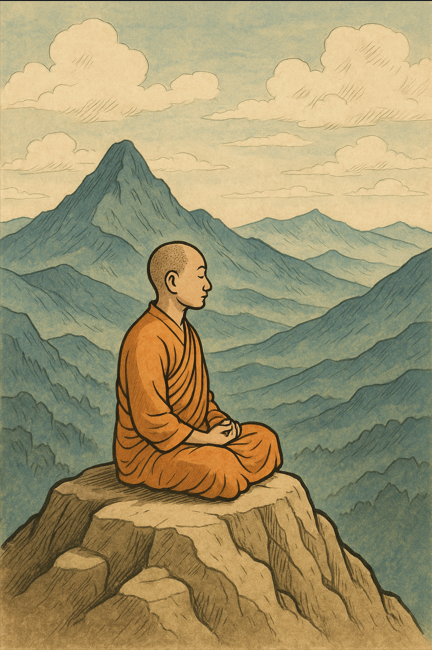Table of Contents
Toggle불교 핵심사상
불교의 핵심 사상은 ‘공(空) 사상’과 그로부터 나오는 무아(無我) 사상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불교의 사상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 사상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데, 우선 의심이 솟아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과 무아는 얼핏 보면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저 철학적인 신선놀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죽음’의 개념으로 공사상과 무아사상을 풀이하려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이는 불교 핵심사상을 떠나 너무 명확한 명제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주어도 팔을 들어 올리듯 내 눈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내 팔은 ‘나’의 일부이지만 내 앞의 바위는 ‘내가 아닌 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는다는 말 자체가 ‘내’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나’가 사라지면 더 이상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것’을 ‘나’라 하여도 그릇됨이 없고, ‘나’를 ‘내가 아닌 것’이라 하여도 그릇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즉 세상에 최상의 깨달음이 있다면, 저는 위 속담이 최하의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위 속담은 끔찍하고 틀렸으며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제가 위선적이어서 이리 말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죽음’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나’랑 ‘내 사촌’이 모두 살아 있는 동안은 ‘나’와 ‘내 사촌’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죽고 ‘내 사촌’도 죽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랑 ‘내 사촌’의 경계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내 사촌 땅을 내 것이라 해도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 부유해 지고 괄목할 성취를 내면 나 역시 죽은 후에는 그들과 경계가 없으니 나 역시 좋은 것 아닙니까?
불교적 가르침의 실천
금강경은 말합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니,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보면 즉시 여래를 본다는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은 허망할까요? 당연히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이 있지요.
이 모든 종교들에서 ‘죽음’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리는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진리가 본인에게만 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큰 평화가 도래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포스트들
탄허 스님, 주역과 정역,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키워드
불교 핵심사상, 불교 핵심사상, 불교 핵심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