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상 사진
Table of Contents
Toggle불교 교리와 불교 이론
불교는 붓다가 창시한 종교로, 붓다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습득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불교에 대해 흔히 존재하는 오해가, 부처님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결코 신이 아니며, 이는 불교의 교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의 존재 목적은 고통을 없애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고, 이를 모두에게 알려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불교에선 누구든 올바른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노력하는 인간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집착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섭니다.
불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집착도 버리는 것이 좋으며, 심지어 불교 자체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집착은 필히 고통을 낳으니 집착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조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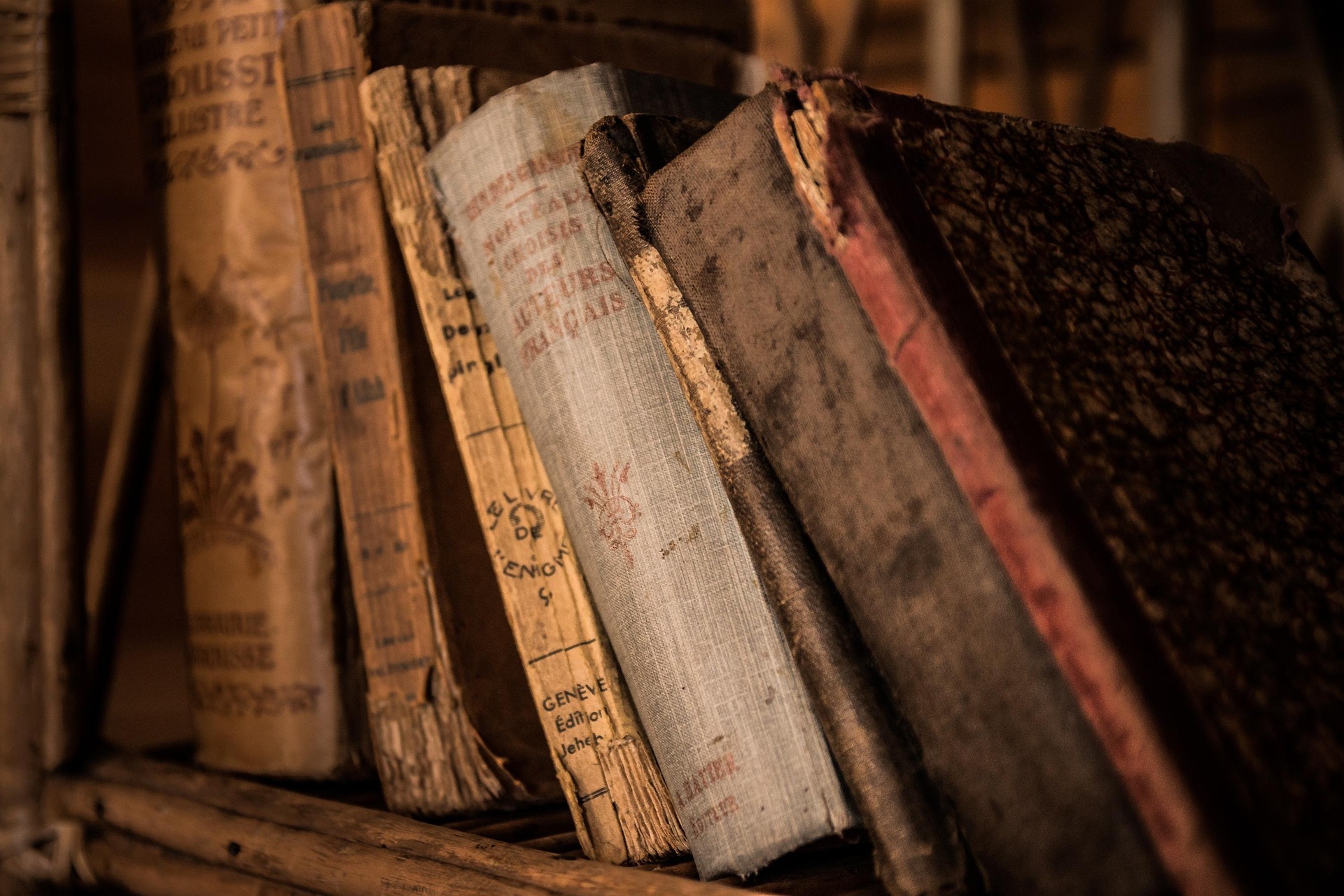
불교 경전에 대하여
유명한 불교 경전으로 600여권 분량의 반야경이 있습니다.
이 반야경의 앞부분을 금강경이라 하고 뒷부분을 반야심경이라 합니다.
금강경
일체유위법. 모든 것은 가짜이니 그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이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가짜와 같이 허망할 뿐입니다.
이로부터 무아의 개념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나 자신 또한 잠시 머물다 흔적 없이 사라질 존재이니, 나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집착을 버리라는, 불교의 핵심 교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반야심경
반야심경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모든 것은 공하다, 이는 곧 인간이 스스로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현실은 영구적이지 않고 피상적이며 금세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공을 완전한 무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공은 인간이 감각으로써 경험하는 현실이 무라고 이야기 할 뿐입니다.
화엄경
대한민국의 유명한 승려 탄허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셨습니다.
스님께서 강연에서 일침처럼 날리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만유를 만드는 그놈은 우주만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일 뿐이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은, 원효대사가 이야기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효대사는 해골물도 마음으로 깨끗한 물로 여기면 그보다 맛있는 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 똑같이 돈을 잃어도 그것을 교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생의 비극으로 볼 것인지는 내 마음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선정
선정은 스님들이 명상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선정 때 스님들은 스스로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비우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마치 온 몸의 근육에 힘을 빼는 것과 같이 정신에 힘을 빼 모든 사고를 의도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스님들은 미래를 보고, 이러한 내용이 예언으로 구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양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인간의 아주 깊은 의식 속에 신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신은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오랫동안 탐구한 정신과 의사들 (칼 융, 스캇 펙 등)은 결국 신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의학을 공부하며 과학을 온전히 공부했는데도 말입니다.
스님들께서 선정 상태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뜬 소리라고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탄허 스님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저명한 승려가 계셨습니다.
원효대사, 사명대사, 탄허 스님… 철학이 발달한 우리나라인만큼 역사 속 불교 계의 거물들도 많았습니다.
탄허 스님에 대해서는 이 포스트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불교 교리의 실천
불교 교리의 실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승려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동시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교리를 실천함에 따라 스스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무아, 일체유심조 등의 불교 이론을 습득하고 만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삶은 오히려 행복에 더 가까워 집니다.
연기법에 관하여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언가가 무언가로 변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얼음을 상온에 두면 녹아 물이 되지요.
이와 같이 사건들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펼쳐지는 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법으로 설명합니다.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불교 교리입니다.
불교와 현대과학
불교라는 종교적 가르침이 과연 현대과학과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가?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간혹 원자 속이 원자 핵을 제외하고는 비어있다는 사실을 공 사상과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 사상은 인간이 살아가며 겪는 감각 및 현상과 더 관계가 깊기 때문에 원자 속 물리학적 빈 공간이 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자역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관찰자 효과는 일체유심조의 원리로, 또 광자, 중성미자와 같은 미립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물리 현상은 연기법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교리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은 정신의학의 측면에서 보아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될 자료들
마무리
이상으로 불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